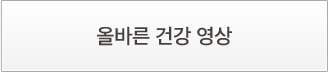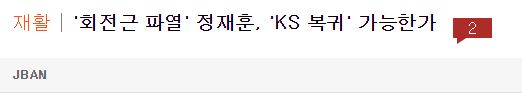| 제목 | [재활] '회전근 파열' 정재훈, 'KS 복귀' 가능한가 |
|---|---|
| 작성자 | 올바른 |
| 등록일 | 2016-10-26 |
| 조회수 | 3022 |
|
[몬스터짐=반재민 기자] 2016년 한국시리즈를 준비하던 두산 베어스에 악재가 생겼다.
핵심 셋업맨이었던 정재훈이 어깨 회전근 파열로 전열에서 이탈했다.
이적하면서 팀의 한국시리즈를 먼발치에서 지켜만 봐야했고, 올 시즌 다시 두산으로 돌아와
프로 데뷔이후 13년간 쌓인 한국시리즈 우승의 한을 풀려했던 그였기에 아쉬움은 더 크다.
부분파열, 투수로써는 가장 중요한 부위인 회전근이 파열된 것이다. 회전근은 어깨 관절을 돌리고, 벌리고 들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견갑골에서부터 상완골로 이어지는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의 4가지 근육을 통들어 회전근이라고 불린다.
어깨의 움직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견갑골은 다른 뼈들과 다르게 지지되어 있지 않아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전근에 의한 안정화가 매우 중요한 곳이다. 때문에 회전근이 파열될 경우에는 극심한 어깨통증을 동반하며, 심한 경우에는 팔을 들어 올리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하나이며, 특히 어깨의 회전을 이용하는 직업군에서는 완전 파열의 위험성도 존재하는 부위 중에 하나다. 그 이유는 바로 회전범위에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 신체에 존재하는 관절 중에 어깨만큼 회전범위가 큰 관절은 없으며 회전범위가 큰 만큼 부상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어깨의 외회전이 110도를 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투수들, 특히 프로에서 활동하는 A급 선수들의 경우에는 외회전이 거의 180도에 육박한다. 더 빠르고, 더 급격히 변화하는 공을 던지기 위해서는 과도한 회전과 비틀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과도한 외회전을 한후 급격히 내회전하면서 팔을 뻗어 어깨가 던져지는 자세를 취하게 되면 이를 지지하는 어깨의 후방 구조물에는
엄청난 장력(늘어나는 방향의 힘)이 걸리게 된다.
정상에 2배 가까이 비틀어지다가(외회전) 다시 반대쪽으로 비틀어지는(내회전) 힘을 계속적으로 받게 된다. 더구나 회전근의 바로 상부에는 견봉이라는 천장이 있기 때문에 회전근은 비틀어지는 내내 견봉과
마찰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미세손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 회전근은 결국 파열된다.
정답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의들의 의견이었다.
특히 2011년 회전근 재건수술을 받은 전병두의 경우에는 전혀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결국 올해 은퇴를 했다. 2013년 회전근 수술을 받은 한기주 역시 올 시즌 겨우 복귀했고, 이전만큼의 빠른 속구를 던지지 못하고 있다. 정재훈도 2011년 중순 어깨 회전근 부상 이후 2012 시즌을 아예 쉬어야했다. 그만큼 어깨 회전근 부상은 야구선수, 특히 투수들에겐 매우 치명적이다.
MLB나 NPB등 해외야구 등지로 사례를 넓혀도 기적적으로 재기한 사례는 많지 않다. 성공적인 재활의 대표적인 예로 뉴욕 메츠의 투수인 바톨로 콜론이다. 1997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 입단해 2005년 애너하임 에인절스(현 LA 에인절스) 소속으로 사이영상을 차지했지만, 그 역시 2006년 어깨 회전근 파열로 은퇴의 기로에 섰다. 하지만, 그는 2008년 콜론의 지방과 골수 줄기세포를 채취하여 섞은 뒤 팔꿈치와 어깨에 주사하는 방식의 치료를 받고 극적으로 부활했다. 하지만, 이후 2012년 오클랜드 어슬레틱스 소속으로 활약할 당시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콜론의 극적인 재기에도
의문 부호가 달린 상태다.
재기할 수 있을까? 그에게 일생일대의 과제가 주어졌다.
<기사원문보기> http://www.monsterzym.com/index.php?mid=health&search_keyword=%EC%B5%9C%EC%A7%84%EB%A7%8C&search_target=tag&document_srl=6116058&category=5673617
|
|
| 이전글 | [재활] 전병두의 인대와 근육은 어디로 사라졌나 |
|---|---|
| 다음글 | [몬스터짐] "뼈는 안부러졌는데..." 피로골절의 모든 것 |